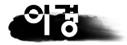형(形) 과 색(色)은 회화의 기본 요소다. 그토록 많은 미술가가 형과 색의 비범한 능력에 이끌렸던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알려진 대로 세잔(Paul Cézanne)은 형태와 색채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사투를 벌인 화가였다. 소설가 D. H. 로렌스(D. H. Lawrence)는 세잔의 회화에 보이는 대상의 지각 방식을 ‘사과성(appleyness)’으로 정의했다. 자연을 원통과 구, 원뿔의 형태로 지각하고, 빛과 공기에 둘러싸인 자연의 색채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광기어린 집착은 ‘클리셰’를 배제한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보는 방식’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세잔이 그린 사과는 상투적인 정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 감지해 낸 근본적인 실재의 표상이 된다.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역시 같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찬장 위의 사과>(1937)에서 노란색 구 모양의 작은 사과 하나를 앞에 두고 세잔과 자코메티는 형과 색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고통스럽게 그려 냈다.
이미 한 세기 전 세잔은 죽음으로 그 고민을 멈출 수 있었고, 50여 년 전 자코메티도 생을 마감하며 끈질긴 고뇌에서 해방되었다. 그 차오르던 고뇌와 집착은 고스란히 현대작가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사과성’으로 일컬어지는 형태와 색에 관한 본유적인 고민과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상하고자 했던 계속된 도전도 쉽게 답을 얻지는 못했다. 어쩌면 과거로부터 실패했던 색과 형태의 윤곽을 찾느라 애꿎은 붓질을 반복하는 건 아닐까. 작가 이경의 애써 침착한 붓질이 고통스럽게 요동치는 것도 그 때문이리라.
순수한 색채와 뒤섞인 감정
세잔과 자코메티가 실존적 형태에 대해 가졌던 오랜 집착만큼이나 작가 이경의 색에 관한 편집증적 태도는 꽤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경의 개인전 <형용사로서의 색채: 어두운-설레는>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에무에 들어서면 눈 앞에 펼쳐진 색의 스펙트럼보다 매캐한 물감 냄새가 후각을 넘저 자극한다. 결코, 중립적이지 못한 이 공간에서 작가는 시각적 교감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전시장 한쪽 벽에 4줄로 가지런히 붙여둔 48장의 흰 도화지에는 각기 다른 색의 붓 자국 313개가 있다. 고작 평붓으로 서너 번 칠한 듯한 이 드로잉을 완성하는데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작가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모호한’ ‘어슴푸레한’ ‘지친’ 등 연필로 적어 놓은 형용사 단어와 ’12:1/2’ ’15:1/4’ 등 당시의 시간을 1/4 단위로 기록한 숫자, ‘1412’처럼 작품번호와 제작연도를 알리는 숫자 등이 붓 작국 주변에 암호처럼 적혀 있다. 이것은 작가의 일기다.
일상의 어느 순간, 특별한 감정이 무언의 색채로 떠오른다. 그것을 놓칠세라 작가는 물감을 푼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실체 없는 색에 다가가기 위해 물도 섞지 않고 조색(調色)과 붓질을 반복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채는 미묘하게 변화해 가다가 어떤 순간적인 확신으로 비로소 ‘완벽한’ 이름을 얻는다. 마치 시약이 묻은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상적으로 반응한 색채 하나를 추출해 작가가 직접 명명한다. 이렇게 선택된 색은 별도의 캔버스에 옮겨져 ‘형용사로서의 색채’라는 지위까지 얻게 된다.
작가는 이 작업에 몇 가지 중요한 장치를 개입시켰다. 말레비치의 ‘영도(zero degree)’ 회화를 연상시킬 만큼 빈틈없는 단색 회화는 순수하다 못해 색 자체에 지극히 충실해 보인다. 색에 압도돼 가까이 다가갈수록 화면을 뚫고 나올 듯 봉인된 단어들이 안정된 시각을 무너뜨린다.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느 날의 감정과 완벽하게 닮아 있는 물감을 캔버스에 칠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커팅 된 문자를 화면 아래에 삽입한 것이다. 작가는 ‘기쁜’ ‘모호한’ 등 추상적 주관적 감정의 형용사를 주관적인 색과 객관적인 고딕 문자로 이중 표기했다. 관객의 시선은 색과 언어로 정의된 기표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왕복한다.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어두운-설레는>(2013) 연작은 순간적인 확신으로 얻어낸 색채 사이의 결합을 시도한다. ‘어두운’과 ‘설레는’의 감정이 교차하는 하이픈(-)의 지점, 무명의 색채들이 부유하는 충돌의 장소를 작가는 모호한 물감층으로 메웠다. 이러한 물감층을 표현하기 위해 이경은 오래전부터 덕테이프를 이용해 왔다. 연속하는 물감층을 만들어 내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물감층만 칠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인접한 면에는 덕테이프를 붙여 완벽하게 가린 후, 계획한 면에 물감을 채우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한다. 물감층이 다 완성되면 작가의 직관적 선택에 의한 색들이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룬다. 하지만 테이프를 떼어낸 그 경계에는 색을 칠할 때 테이프 모서리로 밀려들어 간 물감 자국들이 거친 요철을 남긴다. 우연히 발생한 이 외상적인 파열의 반복이야말로 라캉이 말한 “실재와의 어긋난 만남”인 듯하다.
이경은 애초에 색을 섞으면서 그것이 절대적 확신을 줄 수 없음을 안다. 행여나 잊을까 이름을 적고, 라벨을 붙이고, 번호를 매기고, 시간을 남기고, 공들여 틀에 넣어도 불확실한 ‘형용사’로서의 색채만 화면을 맴돌 뿐이다. 상실에 관한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담은 ‘my love, my seni’처럼, 선명했던 감정의 기록물로서의 색채가 완벽한 붓질로 고정되려는 찰나, 결코 지속될 수 없는 파열을 일으킨다는 것 또한 패럭독스다.
안소연 (미술비평)
In search of form and color
Novelist D. H. Lawrence defined a way of perceiving objects in Cezanne’s painting as “appleyness,” a term he coined. Cezanne perceived nature in the forms of cylinder, sphere, and cone, trying to express the color of nature wrapped up with light and air. He reached an intuitive, instinctive way of seeing through his lunatic obsession, excluding all clichés. In this sense, Cezanne’s apple is not a mere object as a banal still-life but a representation of the fundamental real. Alberto Giacometti was also filled with the same anguish. In Apple on the Sideboard (1937) Giacometti depicted a small apple in the form of a yellow sphere. Cezanne and Giacometti painfully pictured fundamental questions of form and color.
As Cezanne was able to shatter his anguish when he died one century ago, Giacometti was emancipated from persistent agony when his life came to an end 50 years ago. Contemporary artists have taken up such agony and obsession. Such artists have consistently challenged such intrinsic agony of form and color and continuously tried to represent this visually, but they cannot gain solutions with ease. They probably just vacantly reiterate brush strokes to discover color and form others failed to find in the past. That is why artist Lee Kyung’s composed brush strokes appear shaken painfully.
EMOTIONS MIXED WITH PURE COLORS
As Cezanne and Giacometti had long held obsessions with existential form, artist Lee Kyong has a paranoiac attitude toward color. This derives from a quite underlying question. Upon entering Multipurpose Art Hall EMU where Lee Kyong’s solo show Color as Adjective: Dark-Exciting, we are first stimulated by paint smell rather than by the spectrum of colors unfolded before our eyes. The artist calls for us to concentrate on visual communion in this space that is never neutral. 313 brush marks are rendered on 48 pieces of white drawing paper put on the wall of the venue and arranged in four lines in order. The artist explains she spent one and half years completing these drawings that seem to have three or four simple brush strokes. What the artist explains is of significance. Adjectives written in pencil such as ‘ambiguous,’ ‘vague,’ and ‘tired’; figures chronicling the time the drawings were drawn in 1/4 units, such as ‘12:1/2’ and ’15:1/4’; and figures giving information on opus and the year of production such as ‘1412’ are written like secret codes around the brush marks. They are Lee’s diary.
A special feeling recollects some tacit color in a moment of daily life. The artist dissolves colors so as not to miss this. She repeats mixing the colors and making brush strokes to come close to the unsubstantial colors that came to her mind. The colors undergo subtle change with time, and gain ‘complete’ names in a certain moment. The artist herself christens the color ideally reacting to her action, as litmus paper stained with reagent. The color named moves to another independent canvas and gains status as ‘color as adjective’.
Lee uses a few important devices in this work. Monochrome painting similar to Kazimir Malevich’s “zero degree” of painting is pure and extremely faithful to color itself. Words sealed break down stable perspectives. Lee inserts letters cut by laser in a process of applying paints that perfectly resemble transient feelings that disappeared without leaving any trace. The artist represents adjectives expressing abstract, subjective feelings such as ‘delightful’ and ‘ambiguous’. The viewers’ eyes move between signifiers defined in color and language.
In the Dark-Exciting series (2013) set at the center of the venue, Lee tries to fuse colors she found through momentary confidence. The artist fills the place where anonymous colors float and collide with ambiguous layers of paint. Lee uses duct tape to express such layers of paints. It is quite cumbersome to create sequent layers of paints. Whenever one layer of paint is rendered, paint is applied to a plane and left to dry after putting duct tape on a nearby plane. When the layers of paints are completed, colors intuitively chosen form a spectrum. Paint marks leave an uneven surface on the border generated by the detachment of the tape. A reiteration of a rupture that happens by chance seems to be “a missed encounter with the real” in the words of Jaques Lacan.
Lee is aware that color never gives any absolute confidence if mixed. Although she puts labels on colors, numbers them, and puts them in a frame, colors as uncertain “adjectives” hover over her scenes. As in My Love, My Seni encapsulating her firsthand experience of loss, it is also a paradox that color as a record of vivid emotion generates a rupture at the moment the color is fixed by brushwork.
Ahn Soyeon (Art Critic)
 Color as adjective : Dark exciting – Solo Exhibition, Multipurpose Art Hall EMU, 2013
Color as adjective : Dark exciting – Solo Exhibition, Multipurpose Art Hall EMU,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