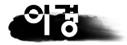감정노동의 해방과 사유언어로서의 색
한국미술사연구소 홍성후
이경은 12년간 자신이 감각하고 사유한 것을 색과 언어로 표상하고 형용해왔다. 때론 규칙적으로 배열하기도, 때론 불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그것은 감정언어를 표현하는 그녀만의 방법이다. 다양한 형용사가 붙여진 색은 과잉된 감정들의 집합적 표현이자 시각화하는 일종의 노동 행위이고 그것을 해방하는 행위로써 도출된 완벽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감각하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상상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부터 모인 추상적 세계의 발현이 그녀에게는 색이요 언어인 셈이다. 상태 혹은 물질이 빛을 반사해 우리 눈에 투영된 추상적인 실제에 다양한 감정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붙여지면, 그것은 이경에게 실존과 내면적 성찰, 경험에 기반한 그 무언가의 표상으로 귀결된다.
가령 ‘블루(blue)’라는 푸른 계열의 색을 예시로 들어보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맑은 날의 푸른 하늘을 묘사하거나 시원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픔’과 ‘우울함(gloomy)’ 따위를 표현하기 위한 수식어로도 사용된다. 가령 코발트(Cobalt)와 프러시안(Prussian) 블루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그 사이의 색이 말하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것을 정확하게 형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닐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한 개인의 내적 경험,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추적하고 형용하는 이경의 작업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행위다. 그녀는 수많은 감정들만큼이나 색의 톤이 다양하다는 것을 탐구하고 분석한다. 인간이 색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감각, 그것이 의미장(semantic field)의 교집합이라는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주장에 착안한 듯하다. 색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적 혹은 공적으로 공유하는 색에 대한 경험이자, 그 경험을 동반한 인상의 역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이러한 색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서 중시했듯,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곧 색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시각적으로 계승하는 행위에 가깝다.
이경의 ‘형용사로서의 색채(Color as adjective)ー명사’는 단순히 장식적인 무엇 혹은 추상적인 형태로만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감정의 표현으로서 현대적 사유와 동일선상에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질곡과 역동성 속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인과 공유하는 감각과 감정, 그것은 예술가로 하여금 개인의 삶과 맞물려 불편하고 우울한 경험이기도 하고, 짧게 공기 중에 흩어지는 기쁨이기도 하며,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른 우울이자 분노,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 이경은 그것을 감정의 색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가령 상실은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요 의식 속에서만 맴도는 불안과 우울의 감정이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들은 그녀뿐만 아니라 사유하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일부이다. 이경은 그것을 기록한다. 수많은 존재의 시간단위별로 변화하는 감정을 색으로, 언어로 형용해 연결하고, 조색하는 작가의 탐구과정이 바로 ‘형용사로서의 색채’이다.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내면의 수행은 모두 득의를 향한 과정이다. 이경의 수행은 매일의 감정을 형용할 수 있는 색을 찾아 조합하고 그것을 수식하고 사유하는 동시에,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무엇인가, 그 세계의 ‘나’는 누구인가 묻는다. 그 뒤에는 해소되지 않는 내면의 탐구와 사유를 넘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깨닫고 그간의 규칙을 전복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새롭게 확장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바로 ‘감각세계’ 시리즈에 집약되었다.
‘감각세계’는 팽창하는 우주에서 하나의 파편을 재구성하는 행위다. 가령 반복되는 우연의 의도적 결합은 작가 자신이 감각한 뜻밖의 세계를 형성해, 그 무한한 가능성을 캔버스에 재현한다. 그러니 그것은 이경이 느낀 감각의 세계관이자 판타지다. 이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관은 ‘과거에서 온 편지’ 시리즈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은 평면 캔버스 위에 ‘형용사로서의 색채’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과 그로부터 파생된 경험을 기록하는 작가의 일기장과 같은 것이자, 스스로의 감정을 착취해 질서를 형성한 작가적 개인사에 해당한다. 즉 그녀는 사유언어로서의 색을 통해 스스로 감정노동을 해방시키는 수행의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경의 언어는 색이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기록하는 행위이자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감정,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을 표상하는 언어의 색이다. 따라서 그녀의 작업은 단순히 보는 행위로만 그칠 것이 아니다. 색을 보고, 형용한 단어를 읽고,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니 그것을 과연 평면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Liberation from Emotional Labor and Color as Private Language
Hong Sung-hoo, Korean Art History Research Institute
For 12 years, Kyong Lee has represented and described what she sensed and contemplated through color and language. Sometimes arranged regularly, sometimes irregularly, this is her unique method of expressing emotional language. Colors attached with various adjectives are a collective expression of excessive emotions, a kind of labor act of visualization, and can be called a perfect coincidence derived as an act of liberating them. The manifestation of an abstract world gathered from endless questions about “what do I sense” or “what do I imagine” is color and language for her. When adjectives modifying various emotions are attached to the abstract reality of a state or substance reflecting light and projected onto our eyes, it results for Kyong Lee in a representation of something based on existence, inner reflection, and experience.
For example, let’s take the bluish color ‘blue’ as an example. This is generally language that can describe the blue sky on a clear day or express coolness, but it is also used as a modifier to express ‘sadness’ and ‘gloominess.’ For instance, the subtle tension between Cobalt and Prussian blue—what emotion does the color between them speak of? Can it be precisely described? Isn’t it subjective? Kyong Lee’s work of tracking and describing the individual’s internal experience through objects that can be seen and confirmed with the eyes, and what necessarily accompanies it, is an act of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to herself. She explores and analyzes that color tones are as diverse as countless emotions. It seems to be inspired by Markus Gabriel’s assertion that the emotions and sensations humans feel through color are the intersection of semantic fields. Recognizing color is an experience of color shared privately or publicly, and is an inevitable result in which the role of impressions accompanying that experience must operate. Her recognition of color is close to an act of visually inheriting Wittgenstein’s theory that what is shown to people is the criterion for judging color, just as Ludwig Wittgenstein emphasized in his philosophical thinking.
Kyong Lee’s ‘Color as adjective—noun’ cannot be discussed simply as something decorative or merely in abstract form. This is on the same level as contemporary thought as an expression of the sensations and emotions we feel. The sensations and emotions shared with others living in the contemporary era amid the constantly changing trials and dynamism of modern Korean society—for an artist, this can be uncomfortable and depressing experiences intertwined with personal life, joy that briefly disperses in the air, and can be accompanied by melancholy, anger, and anxiety rising from deep within. Kyong Lee visualizes them as colors of emotion. For example, loss is something that cannot be described in words, an emotion of anxiety and melancholy that only lingers in consciousness. Temporary and momentary emotions are part of the sensations that not only she but anyone who thinks can feel. Kyong Lee records them. The artist’s exploratory process of connecting and mixing emotions that change by time units of numerous existences, describing them in color and language, is precisely ‘Color as adjective.’
Endless questions about oneself and inner practice are all processes toward enlightenment. Kyong Lee’s practice combines and modifies colors that can describe daily emotions while contemplating them, simultaneously asking what the world she created is and who ‘I’ am in that world. Beyond this lies the exploration and contemplation of the unresolved inner self, and she realizes how illusory the environment and society surrounding her are and attempts to subvert the previous rules. And a series of attempts to newly expand is concentrated in the ‘Sensory World’ series.
‘Sensory World’ is an act of reconstructing one fragment in an expanding universe. For example, the intentional combination of repeated coincidences forms an unexpected world that the artist herself sensed, reproducing its infinite possibilities on canvas. So it is Kyong Lee’s worldview and fantasy of the sensory world she felt. The worldview Kyong Lee wants to show is well represented in the ‘Letters from the Past’ series. This is like the artist’s diary recording emotions that change moment by moment as ‘Color as adjective’ on a flat canvas and the experiences derived from them, and corresponds to an artistic personal history that forms order by exploiting her own emotions. In other words, she is in a process of practice that liberates emotional labor through color as private language.
In other words, Kyong Lee’s language is color. It is an act of recording her own existence and the color of language that represents emotions inflowing from outside such as society and environment surrounding her, and the sensations that accept them. Therefore, her work should not end merely as an act of viewing. Seeing colors, reading the descriptive words, and feeling those emotions—can this really be called flat art?